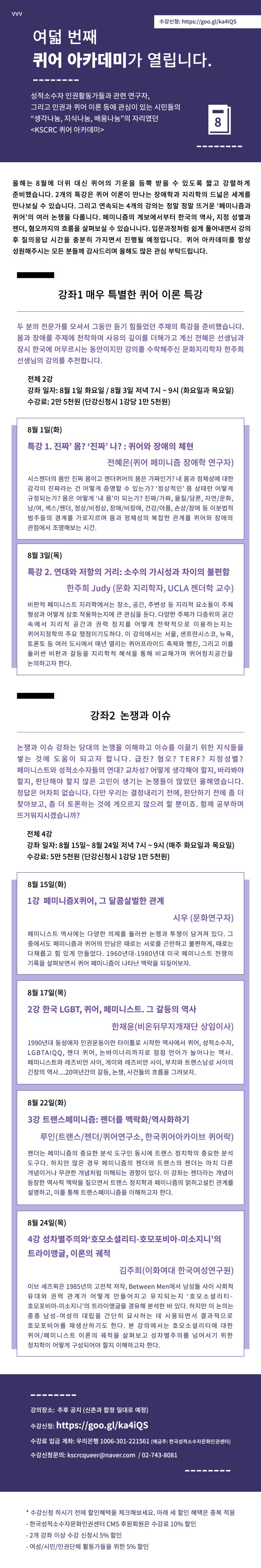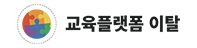[진행 완료] 2017 KSCRC 여름 퀴어아카데미
| 연도 | 2017 |
|---|---|
| 형식 | 퀴어 아카데미 |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그동안 듣기 힘들었던 주제의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몸과 장애를 주제에 천착하며 사유의 깊이를 더해가고 계신 전혜은 선생님과 잠시 한국에 머무르시는 동안이지만 강의를 수락해주신 문화지리학자 한주희 선생님의 강의를 추천합니다.
시스젠더의 몸만 진짜 몸이고 젠더퀴어의 몸은 가짜인가? 내 몸과 정체성에 대한 감각이 진짜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정상적인’ 몸 상태란 어떻게 규정되는가? 몸은 어떻게 ‘내 몸’이 되는가? 진짜/가짜, 물질/담론, 자연/문화, 남/여, 섹스/젠더, 정상/비정상, 장애/비장애, 건강/아픔, 손상/장애 등 이분법적 범주들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몸과 정체성의 복잡한 관계를 퀴어와 장애의 관점에서 조명해보는 시간.
비판적 페미니스트 지리학에서는 장소, 공간, 주변성 등 지리적 요소들이 주체 형성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큰 관심을 둔다. 다양한 주체가 다층위의 공간 속에서 지리적 공간과 권력 정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하는지는 퀴어지정학의 주요 쟁점이기도하다. 이 강의에서는 서울, 샌프란시스코, 뉴욕, 토론토 등 여러 도시에서 매년 열리는 퀴어프라이드 축제와 행진, 그리고 이를 둘러싼 비판과 갈등을 지리학적 해석을 통해 비교해가며 퀴어정치공간을 논의하고자 한다.
논쟁과 이슈 강좌는 당대의 논쟁을 이해하고 이슈를 이끌기 위한 지식들을 쌓는 것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급진? 혐오? TERF? 지정성별? 페미니스트와 성적소수자들의 연대? 교차성?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바라봐야 할지, 판단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생기는 논쟁들이 많았던 올해였습니다. 정답은 어차피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결정내리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좀 더 찾아보고, 좀 더 토론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으려 할 뿐이죠. 함께 공부하며 뜨거워지시겠습니까?
페미니스트 역사에는 다양한 의제를 둘러싼 논쟁과 투쟁이 담겨져 있다. 그 중에서도 페미니즘과 퀴어의 만남은 때로는 서로를 곤란하고 불편하게, 때로는 다채롭고 힘 있게 만들었다. 1960년대-1980년대 미국 페미니스트 전쟁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퀴어 페미니즘이 나타난 맥락을 되짚어보자.
1990년대 동성애자 인권운동이란 타이틀로 시작한 역사에서 퀴어, 성적소수자, LGBTAIQQ, 젠더 퀴어, 논바이너리까지로 점점 언어가 늘어나는 역사. 페미니스트와 레즈비언 사이, 게이와 레즈비언 사이, 부치와 트랜스남성 사이의 긴장의 역사….20여년간의 갈등, 논쟁, 사건들의 흐름을 그려보자.
젠더는 페미니즘의 중요한 분석 도구인 동시에 트랜스 정치학의 중요한 분석 도구다. 하지만 많은 경우 페미니즘의 젠더와 트랜스의 젠더는 마치 다른 개념이거나 무관한 개념처럼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 강좌는 젠더라는 개념이 등장한 역사적 맥락을 짚으면서 트랜스 정치학과 페미니즘의 얽히고설킨 관계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트랜스페미니즘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브 세즈윅은 1985년의 고전적 저작, Between Men에서 남성들 사이 사회적 유대와 권력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 ‘호모소셜리티-호모포비아-미소지니’의 트라이앵글을 경유해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논의는 종종 남성-여성의 대립을 간단히 묘사하는 데 사용되면서 결과적으로 호모포비아를 재생산하기도 한다. 본 강의에서는 호모소셜리티에 대한 퀴어/페미니스트 이론의 궤적을 살펴보고 성차별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정치학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 이해하고자 한다.